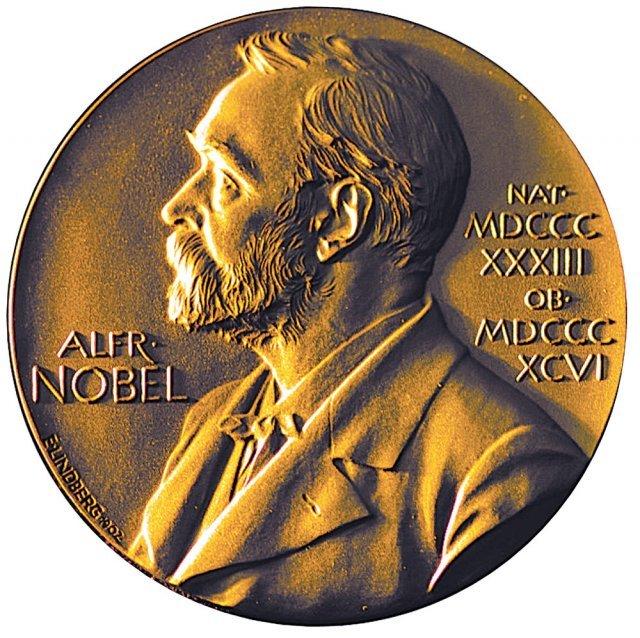 노벨상 메달/이미지=구글
노벨상 메달/이미지=구글
스포츠 경기라면 온 국민이 분노했을 한일전 스코어가, 올해는 노벨상 전광판에 선명히 찍혔다. 일본 27명, 한국 0명. 일본은 1949년 이후 매년처럼 노벨 과학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여전히 ‘0’의 늪에 갇혀 있다.
겉보기에는 투자도, 통계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 OECD R&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12%를, 한국은 오히려 15%를 기초연구에 투입하고 있다. 금액으로도 한국은 연간 18조 원을 쏟아붓는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태도’다.
한국 사회는 연구를 ‘성과 사업’으로, 학문을 ‘스펙 제조’로 만들어버렸다. 연구자는 실험보다 보고서에, 논문보다 평가표에 시달린다. 프로젝트는 2~3년 단위로 잘려 나가고, 연구비는 단기 실적이 없으면 끊긴다. 일본이 반세기 넘게 한 명의 과학자에게 ‘평생 연구할 권리’를 줬다면, 한국은 박사조차 계약직으로 내몬다. 이 나라의 연구자는 실험보다 생존을 고민한다.
기초과학의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과 기업의 구조적 탐욕이다. 대학은 학문보다 의전원 입시 실적을 중시하고, 교수는 제자보다 연구비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가깝다. 기업은 단기 주가에만 매달리며 ‘R&D’ 대신 ‘MKT(마케팅)’을 외친다. 청년들은 과학자가 아닌 공무원, 의사, 대기업 입사를 꿈꾼다. 그 결과, 연구실은 비고, 실험대 위엔 먼지가 쌓인다.
노벨상은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사회의 거울이다. 일본이 1970년대부터 자율과 신뢰로 연구 생태계를 키워온 반면, 한국은 지금도 연구자의 시간을 통계와 평가로 쪼개고 있다. 기초연구 예산을 깎고, 연구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대학을 입시 공장으로 만든 사회가 어떻게 ‘발견과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다. 연구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바이씨즈, 실리프팅 브랜드 ‘자보실’로 리뉴얼… 볼륨실 ‘자보쇼츠’ 출시
메디컬 뷰티 테크기업 '바이씨즈'가 실리프팅 브랜드 ‘자보핏(ZAVOFIT)’을 ‘자보실(ZAVO THREAD)’로 리뉴얼하고, 특허받은 D-MESH(더블메시) 구조 기반의 차세대 볼륨실 ‘자보쇼츠(ZAVO SHORTS)’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리브랜딩과 신제품 출시는 바이씨즈의 프리미엄 실리프팅 라인업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
바이씨즈, 실리프팅 브랜드 ‘자보실’로 리뉴얼… 볼륨실 ‘자보쇼츠’ 출시
메디컬 뷰티 테크기업 '바이씨즈'가 실리프팅 브랜드 ‘자보핏(ZAVOFIT)’을 ‘자보실(ZAVO THREAD)’로 리뉴얼하고, 특허받은 D-MESH(더블메시) 구조 기반의 차세대 볼륨실 ‘자보쇼츠(ZAVO SHORTS)’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리브랜딩과 신제품 출시는 바이씨즈의 프리미엄 실리프팅 라인업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
 정덕영 클릭트 대표, 독자 기술인 XR 스트리밍 지연 보정 기술로 ‘대통령 표창’ 수상
클릭트는 정덕영 클릭트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3일 주최한 ‘2023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XR을 위한 화면 지연 보정을 위한 MTP Latency 개선기술’에 대한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공로로 기술개발과 제품화, 관련 산업기술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산업기술진흥유공 신기술실용화 부문 대통령 표창.
정덕영 클릭트 대표, 독자 기술인 XR 스트리밍 지연 보정 기술로 ‘대통령 표창’ 수상
클릭트는 정덕영 클릭트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3일 주최한 ‘2023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XR을 위한 화면 지연 보정을 위한 MTP Latency 개선기술’에 대한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공로로 기술개발과 제품화, 관련 산업기술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산업기술진흥유공 신기술실용화 부문 대통령 표창.
 푸마가 성사시킨 두 천재의 만남, 망누스 칼슨과 펩 과르디올라
글로벌 스포츠 기업 푸마(PUMA)가 맨체스터 시티 풋볼 클럽(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체스닷컴(Chess.com)과 함께 두 천재: 축구계의 펩 과르디올라(Pep Guardiola)와 체스계의 매그너스 칼슨(Magnus Carlsen)의 독점 대담을 론칭했다. 이 푸마 홍보대사들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스포츠의 전략과 전술을 자세히 들려...
푸마가 성사시킨 두 천재의 만남, 망누스 칼슨과 펩 과르디올라
글로벌 스포츠 기업 푸마(PUMA)가 맨체스터 시티 풋볼 클럽(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체스닷컴(Chess.com)과 함께 두 천재: 축구계의 펩 과르디올라(Pep Guardiola)와 체스계의 매그너스 칼슨(Magnus Carlsen)의 독점 대담을 론칭했다. 이 푸마 홍보대사들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스포츠의 전략과 전술을 자세히 들려...

